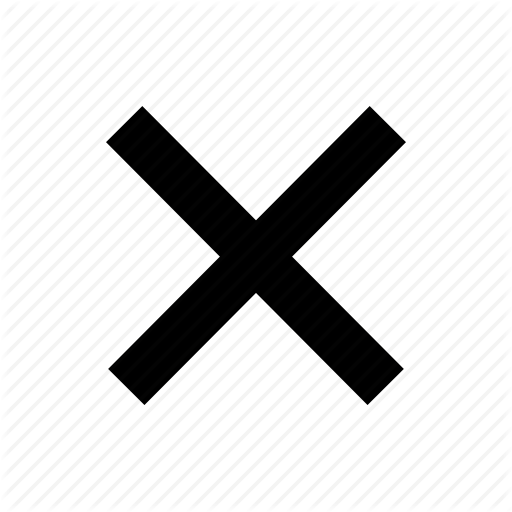오늘, 나는 춘천으로 간다.
기차를 타고 갈 것이다.
오후 4시 45분 청량리 출발, 남춘천 6시38분 도착.
이음아트에 대한 포스트를 아직 얼굴도 못본 어느 고교 동문 후배가
동문 사이트에 올렸다.
그걸 보신 까마득한(! 15년 선배님이시니 '까마득'이 그리 과한 표현은 아니리라) 선배님께서
상준이에게 전화를 하셔서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두 권의 책을
몇 십권이나 주문하셨단다.
그리고 그 책을 춘천 지역의 동문들께 선물하셨단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많은 걸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춘천으로 달려가는 것.
고마운 선배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
가끔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이 많은 선물들을 고스란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추운 날, 춘천으로 가는 기차에 오를 것이다.
내 스무 살 시절, 참 많이도 들락거렸던 춘천이다.
이십몇 년의 추억들이 차창 밖으로 흘러가겠지.
그 추억들에 감사하게 되겠지....
| 춘천, 또는 기억의 다른 이름 | 풍경, 사람 | 2006/02/05 13:04 | | | http://blog.naver.com/joon6078/30001546405 | |
춘천에 다녀왔다.
입춘, 봄으로 들어가는 문턱은 몹시도 추웠다.
두 건의 책 관련 미팅을 마치고 허겁지겁 청량리로 달려갔다.
이음아트의 후배 상준이는 한참 전에 도착해서 떨고 있었다.
대학로에서 청량리가 그렇게 금방일 줄 몰랐다고.
전날 잠을 잘 못 잤다고 했다.
지난 여름 서점 준비하면서부터 어디로 멀리 가보는 게 처음이라고 했다.
상준이의 표현을 옮기자면, '긴장했다'고 했다.
기차가 청량리역를 빠져나왔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춘천을 찾았는지를 기억했다.
무슨 기억력을 그렇게 저주처럼 달고 다니냐고 핀잔 듣는 사람인 내게
그 마지막 춘천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가만, 그게 수란이의 초대였던가? 인도 친구 날리니, 화선이...등과 함께 갔었던.
그렇다면 그건 아직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다.
아냐, 그렇게 오래 전의 일일 리가 없는데?
상준이가 들고온 양념 닭다리와 홍익회 카트에서 산 음료를 먹었다.
금요일 오후의 춘천행 기차는 온갖 비닐 봉투와 소줏병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로 가득차 있었다.
대성리, 청평, 가평, 강촌....
기차가 멈출 때마다 한 떼거리씩 그 청춘들이 내렸다.
문득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저들에게도 세월이 흐르겠지.
그리고 이십년쯤의 세월이 흐른 다음,
어쩌다가 이 기차를 다시 타게 되겠지.
비닐봉투와 소줏병을 든 청춘들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리겠지....
아주 오래 전이 되어 버린 청춘의 시절이 순식간에 되살아나겠지.
대학 1학년 때였던가.
춘천이 고향인 친구가 있었다.
춘천의 중앙로 시장통이 친구의 집이었다.
닭갈비를 먹었을 것이다. 물론 소주를 마셨을 것이다.
이외수를 기억했을 것이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지독히 추웠던 겨울의 막바지가 중요하다.
그날도 춘천 출신 친구와 또 다른 친구, 이렇게 셋이서 춘천에 있었다.
그게 아침이었던가, 아니면 오후였던가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춘천댐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 대낮에도 우리의 손에는 소줏병이 담긴 작은 비닐 봉지가 들려 있었다.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춘천댐의 호수는 꽝꽝 얼어 있었다.
사람 하나 없는 호수에서 자꾸 쩡쩡 커다란 소리가 퍼져나왔고
소리는 호수를 둘러싼 산들에 부딪쳐 몇 배로 큰 소리가 되어 돌아왔다.
아마 호수의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때는 겨울의 막바지였으니까.
무엇 때문이었는가?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병나발로 불었던 이유는?
물론 나 혼자만 소주를 마신 건 아니었다. 셋 다 취해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미끄러운 얼음 호수 위를 내가 달려갔던 이유는?
달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달리다가 쫓아온 친구들에게 허리를 잡혔다.
내버려 두라고 내가 소리쳤던가? 그 소리가 얼음 깨지는 소리에 묻혔던가?
얼음 위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던가? 무엇이 그리 서러워서?
청춘이 서러웠던 거겠지, 달리 뭐였겠는가. 원래 청춘은 서러운 법인데.
겨울, 얼어붙은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달리고 넘어지고 달아나고 붙잡히고
그 한심한 청춘의 흑백 사진 한 장. 내 머리 속에 남은.
오랫동안 부끄러웠으나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기차가 남춘천역에 도착했다.
하얀 백발의 단아하신, '까마득한' 선배님께서 몸소 역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15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이제 나는 안다.
효자동 선배님 댁에서 사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저녁을 얻어먹고,
소주도 얻어마셨다.
차도 얻어마셨고, 다시 복분자도 얻어마셨고, 또 차를 얻어마셨다.
1963년, 내가 코 찔찔이 아이였을 때 나온 선배님의 고등학교 졸업앨범도 보았다.
선배님께서 중앙 선배일 뿐만 아니라,
중앙 문예반의 선배님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배님은 이런저런 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이런저런 책을 또 선물해 주셨다.
밤이 깊었고, 꼬냑병을 새로 꺼내오신 선배님께서
<목동>의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상준이가 꼬냑병을 외투 안에 숨겼고,
선배님의 지인 두 분이 그 한밤의 노래 한 판에 합류하셨다.
마흔일곱, 마흔다섯, 나와 상준이, 늙다리 중년들이 그날 밤엔
'어린 꼬맹이'들이 되어 노래부르고 춤도 추었다.
생각해 보라. 선배님께서 고등학생이셨을 때,
우린 기저귀 찬 아기들이었다는 얘기다.
우주의 상대성 원리, 시간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나이의 상대성 원리,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우주의 법칙인가 말이다.
아침이 왔고, 다시 사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침밥을 먹고
춘천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상준이는 서점 문을 열어야 했고, 내게도 약속이 있었다.
배웅 나오신 선배님께서 내 손을 꽉 잡으신 채로 물으셨다.
"우리 후배님들, 빵값 주면 받을 거야?"
물론 당신이 짐작하는 대로 나는 선배님이 주신 '빵값'을 받았다.
우린 '어린 후배'였으니까.
그 빵값에서 택시비를 내고 남춘천역에 내렸다.
하늘은 얼음처럼 투명하고 차가웠다.
아침 9시 35분, 춘천을 떠나는 기차를 기다리며
우린 역광장에 세워진 춘천관광 안내도를 보았다.
춘천댐, 공지천, 소양댐, 청평사...
아주 오래 전, 그날도 그렇게 춘천을 떠나는 기차를 기다렸다.
아니, 그날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문학청년들.
출발하면서 그들은 다짐했다.
절대로 고스톱과 포커는 치지 말자고.
절대로 밖에 나가 당구를 치지 말자고.
밤을 새워 시만 이야기하자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더 이상 대학1학년, 2학년이 아니었다.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이었고,
심지어 몇몇은 이미 학교를 떠난 사회인들이었다.
그들은 닭갈비에 술을 마셨고,
'딱 한 게임만!'으로 시작한 당구를 쳤고 고스톱을 쳤다.
시는 그날 밤, 그들의 세상에서 추방되었다.
부스스한 얼굴로 서울로 돌아가는 차를 기다리던 그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인생에 굴복하기 시작한 사내들의 얼굴....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잠에 굴복했다.
기차가 서울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야 눈을 떴다.
차창으로 얼굴들이 흘러갔다.
얼굴들.
내 삶에서 스스로 떠났거나, 추방되었거나,
어찌해서였든 흘러가 버린 얼굴들.
청량리역 개찰구를 나서며 표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선배님께서 주신 빵값이 만져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