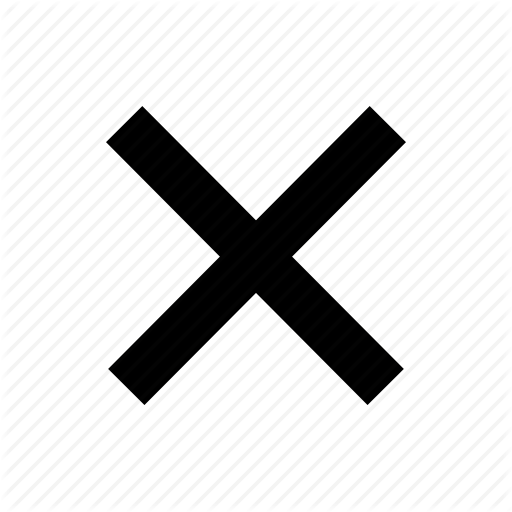이찬근(66회) 교우, 동아일보 2002.11.8.(금) 금요칼럼
본문
[금요칼럼]이찬근/은행,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img src="http://www.donga.com/photo/news/200211/200211070264.jpg" border=0 align=left hspace=10 vspace=10>
2000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권은 총파업이란 큰 홍역을 치렀다. 온건 보수 성향이겠거니 안심했던 은행권 노조(금융산업노조)가 유례 없이 동원력과 전투성을 발휘했으니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이제 은행권은 서울-하나은행간 합병계약에 이어, 정부가 보유한 조흥은행 지분의 매각 일정이 이달 말로 다가옴으로써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속사정이야 어찌됐건 정부측의 논거가 고용안정을 바라는 은행원의 절실한 입장을 압도하지 않는 한 불상사가 우려되기도 한다.
▼새로운 사업 경쟁력 갖춰야▼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민영화 추진의 목표를 슬며시 바꾸었다는 데에 있다. 최근 서울-하나은행간 합병계약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지분 매각 대금을 신주로 받아 결제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란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났고, 연이어 조흥은행의 지분마저 신한은행에 매각해 대형화 구조조정을 재차 유도하려 한다는 루머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의 대형화 논리엔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대형화 주창론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간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세계의 금융산업은 정보처리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은행들도 하루빨리 규모를 키워 막대한 IT 투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선진 각국의 은행 점포를 방문해 보면 이미 현금출납과 같은 기존의 저부가가치성 창구 업무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고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자산관리, 보험 및 노후연금 알선, 세무 및 법무 상담 등 전천후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영업체제로 환골탈태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엔 이의를 달 수 없지만, 은행 대형화가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 실질 예금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이 기존의 상품 구조를 고집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존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원스톱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측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은행의 겸업화 종금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개의 현장 직원이 은행상품과 보험 증권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히딩크식 멀티플레이어로 거듭 태어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 확보를 전제하지 않고 은행 대형화만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인해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못지않게 마땅히 자산을 운영할 대상을 찾지 못한 은행들이 특정 분야에 쏠림으로써 은행권 전체가 부실화되는 시스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그간 규모만 잔뜩 키운 채 기업대출에 의욕을 상실한 은행들이 가계 및 부동산대출에 열광적으로 매달린 결과 새로운 부실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최근 한 대형 은행의 행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인도나 중국 같은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새로운 역량의 축적과는 무관한 것이고 동아시아 위기 사태 이전, 고위험을 불사하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시장에 쇄도했던 쓰라린 기억을 되살리는 일일 뿐이다.
▼무리한 통합보다 겸업화를▼
이제 은행업은 본연의 개혁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고객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 고객은 금융자산의 수익성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으므로 은행은 겸업화 종금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침 태풍의 눈이 되어 있는 조흥은행이나 신한은행은 그동안 모두 종합금융 그룹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민영화를 빌미로 이들을 무리하게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상호간 핵심 역량 키우기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영화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경쟁의 수위를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객원논설위원 ckl1022@incheon.ac.kr